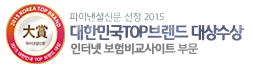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전 국민의 숙원 사업으로도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2009년부터 벌써 14년째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현재 전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하고 있음에도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20대 대선 후보 당시 실손 청구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전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다수 여야 의원은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에 합의했지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오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실손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한다.
그간 의료계 눈치만 보던 국회도 윤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매듭을 짓고 싶어하는 모양새다.
앞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지만 의료계는 지금까지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두고 보험사가 환자의 진료내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을 심사 및 평가하는 준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사익에 기여하는 꼴이라며 심평원 중계기관 선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사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비급여 항목까지 들여다보게 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과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보험개발원도 결국은 보험사와 한통속이라며 또 다시 반대했다.
특히 의료계는 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의 집적성·보안성 등을 문제 삼아 중계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대안도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다. 개정안에 업무외 데이터 사용 혹은 집적 금지, 외부 누설 금지, 처벌 조항 등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다.
현재 청구 불편으로 청구를 포기한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 안그래도 적자인 실손 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실손 청구 간소화에 힘쓰고 있다.